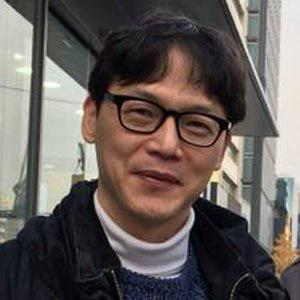
지난주 PD수첩 ‘검찰 기자단’이 방송된 이후 법조 기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모양이다. 5일 대법원 기자단이 PD수첩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아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 이가영 기자가 그 주인공이다.
나는 이가영 기자를 잘 아는 편이다. 이가영 기자도 나를 모른다고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함께 전장을 누빈 사이인데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 않겠나?
이가영 기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보수 기자가 됐다는 이야기부터, 그것보다 훨씬 더 황망한 이야기들까지. ‘내가 아는 그 이가영이 맞나?’ 싶은 생각을 수 십 번도 더 하게 만들었던 소문들이었다.
무력보다도 강한 헤게모니
이탈리아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카를 마르크스와는 또 다른 지평을 연 위대한 투사이자 사상가였다. 무솔리니 정권의 검사는 1928년 재판에서 “우리는 이 자의 두뇌가 작동하는 것을 20년 동안 중지시켜야 한다”는 유명한 말로 그람시를 옥에 가뒀다. 하지만 파시스트들의 소망과 달리 그람시의 두뇌는 멈추지 않았다. 그람시의 명저 <옥중수고>도 그가 감옥 시절 남긴 원고를 기반으로 탄생한 책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영국, 독일, 프랑스가 아니라 후진적 농업국가였던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일어났다.
이런 현상 대한 그람시의 통찰은 실로 뛰어났다. 후진적 농업국가에서 지배자들은 무력으로 민중들을 통치한다. 이런 체제에서는 혁명가들은 당연히 무력으로 저항한다. 후진적 사회에서 혁명의 성패는 결국 보유한 무력의 크기에서 결판난다.
반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지배자들은 무력으로 세상을 통제하지 않는다. 이런 나라에는 ‘시민사회’라는 것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 지배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어지간해서 이 합의는 깨지지 않는다. 설혹 혁명이 성공한다 한들, 시민사회의 합의된 여론이 이를 다시 되돌려 놓는다.
그람시는 이 합의된 힘을 ‘헤게모니’라고 불렀다. 또 그람시는 시민사회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무력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주장했다.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그람시가 제시한 전술이 진지전이다. 무력 사회에서는 기동전만으로도 얼마든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헤게모니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사회 공론의 장에서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이 일을 누가 해낼 것인가? 그람시는 이 무거운 책무를 지식인에게 맡겼다. 학자, 언론인, 교사 같은 지식인들이 공론의 장에서 진보와 변혁의 이념으로 헤게모니 싸움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녕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가?
내가 이 이론을 처음 접한 때는 1993년이었다. 악랄했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시기다. 당시 운동진영에서는 앞으로의 투쟁 방식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군부독재의 무력 통치 시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화염병을 던지며 싸우면 됐다. 그런데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적어도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와 달리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보수세력은 군부독재의 총칼에 의지하던 통치의 한계를 깨닫고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보수정장을 만들어 새로운 통치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들이 보수정당-재벌-보수언론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사회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이런 세상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은 올바른 투쟁이 아니라는 의식이 싹텄다. 상대가 헤게모니 지배를 시작한 이상, 우리 역시 시민사회로 깊숙이 들어가 진지전을 감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내가 속했던 운동그룹이 이런 주장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나 역시 이 주장에 동의했다.
고백하자면 당시 나는 비겁했다. 진보적으로는 살고 싶고, 너무 가난하게는 살기 싫고…. 이 갈등 속에서 “지식인으로서 헤게모니 투쟁을 하는 것이 변혁의 최대 과제”라는 그람시의 가르침은 나에게 퇴로를 열어주었다. 그래서 나는 기자가 됐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비겁함이 많이 부끄럽다.
이 허접한 개인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이가영 기자가 나와 같은 운동그룹에 속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와 나는 같은 공간에서 지식인의 임무와 헤게모니 투쟁을 함께 고민했다.
우리는 그때 “지식인의 임무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배웠다. “지식인은 지배자들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진지 안에서 굳건히 버텨야 한다”고 다짐도 했다. 이가영 기자가 혹시 “나는 그런 다짐 안 했는데요”라고 발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기억으로 그런 다짐을 제일 열심히 떠들고 다닌 이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었다.
지식인이 힘든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힘든 육체노동을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인에게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펜을 놀리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소중한 기회를 준 민중들의 마음에 감사하며, 진보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이가영 기자, 딴청 피우지 마라. 당신과 내가 함께 배웠던 바로 그 내용이다. 게다가 이가영 기자는 배우는 걸 넘어서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다니지 않았나?
2001년 기자협회보 인터뷰를 보니 이가영 기자는 “외로워서 선후배들과 술 마시느라 대학 때 성적이 안 좋았다”라고 중앙일보 면접 때 이야기했단다. 그러면 당신에게 당시 투쟁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취미생활이었나? 취미 치고는 너무 열심히 했던 것 아닌가? 그 투쟁이 정녕 취미생활이었다면, 당신은 기자가 아니라 연기자를 했어야 했다. 당신의 연기는 너무 실감났었거든.
돌아오지 않을 다리를 건넌지 오래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그래, 알겠다. 한번 건넌 다리를 다시 되돌아 올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부끄러워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도 나는 슬프다. 30년 전 당신을 동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아둔함이 슬픈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