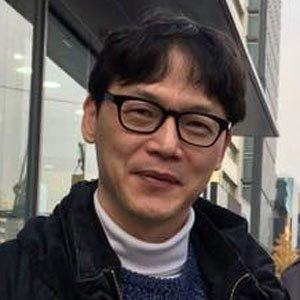
3월 25일자 조선일보에 기생충 연구로 유명한 단국대 서민 교수의 글이 실렸다. 제목은 ‘문빠가 언론 탄압하는 시대, 조선일보 없었다면 어쩔 뻔’이었고, 내용은 “문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공공연하게 언론 탄압을 자행하는 이 시대에, 조선일보마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가 무척 고맙다는 이야기다.
추정을 해보자. 이 칼럼에는 [나와 조선일보_17]이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즉 이 칼럼은 [나와 조선일보]라는 이름의 시리즈인 셈이다. 검색해보니 창간 10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가 이를 기념해 독자들에게 [나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여기저기 요청한 모양이다. 농구감독 허재 씨,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기고를 한 것으로 나온다. 조선일보가 서민 교수에게도 기고를 부탁했고 서 교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 듯 보인다.
그래서 탄생한 글이 이 경악스러운 칼럼이다. ‘조선일보 없었다면 어쩔 뻔’이라니! 조선일보가 없었다면 어쩌긴 뭘 어쩌냐? 종이 낭비 막아 환경이 좋아지고, 나라가 평화롭고 행복했겠지.
물론 남 생일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악담을 늘어놓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서 교수가 왜 조선일보의 생일잔치 초대에 응했냐는 거다. 잔치 자리에 악담을 늘어놓기가 뻘쭘하다면, 그 자리에 안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서 교수는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요청한 기고를 받아들이는 순간, 서 교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문전걸치기 전략
길을 걷다가 유명한 아동구호단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로부터 “스티커 한 장만 붙여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라며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문전걸치기 전략(foot-in-the-door technique)이라는 마케팅 전략의 타깃이 된다.
스티커를 붙이면 상대는 “그곳에 투표하셨군요. 사실 많은 분이 같은 곳에 투표를 하세요. 그 투표의 의미는…”이라며 숨 쉴 틈도 없이 설명을 쏟아낸다. 그리고 세계 각국 어려운 어린이들의 처지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마음이 뭉클해질 때쯤, 그들은 내 앞에 정기후원자가 돼 달라는 요청서를 놓는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거절을 못한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조금 이상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연대에 참여한다.
1966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소속 두 심리학자 조너선 프리드먼(Jonathan I. Freedman)과 스콧 프레이저(Scott C. Fraser)가 『압박 없이 복종시키기 : 문전걸치기 기술(Compliance without pressure : The foot-in-the-door technique)』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이 이론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 그리고 마케팅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론의 요지는 이렇다. 처음부터 묵직한 부탁을 들이미는 것보다, 누구나 들어줄 수 있는 쉬운 부탁으로 시작해 점차 큰 부탁을 하는 것이 승낙을 받을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두 그룹의 가정주부들에게 부탁을 했다. A그룹에게 전화를 해 “당신 집에 있는 집기들에 대해 알고 싶은데, 남자 네, 다섯 명이 집을 방문해 두 시간 정도 집을 살펴봐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이건 매우 어려운 부탁이다. 당시만 해도 가정주부는 대부분 여성이었고, 그 집에 모르는 남자 네, 다섯 명이 들이닥쳐 두 시간 동안 집을 뒤지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
반면 B그룹에게는 먼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집기들에 대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던졌다. 이건 답하기 어려운 요청이 아니다. 답을 들은 실험팀은 사흘 뒤 다시 전화를 걸어 A그룹에게 던진 것과 같은 요청을 했다. 요청 내용은 같았지만 ‘쉬운 부탁’을 사흘 전에 했다는 것이 유일한 차이였다.
실험 결과 B그룹 주부들이 남자들의 방문을 수락할 확률이 A그룹의 그것보다 갑절이나 높았다. 쉬운 부탁을 들어준 사람들이 어려운 부탁도 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 이론의 이름이 ‘문 안에 발을 걸치는 기술(foot-in-the-door technique)’인 이유가 이것이다. 중요한 부탁을 위해서는 먼저 가벼운 부탁으로 승낙을 얻는 게 유리하다. 사람에게는 일관성을 지키려는 습성이 있어서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큰 부탁을 들어준다.
첫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Cialdini) 교수는 “문전걸치기 전략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요청이라도 함부로 승낙하지 말라. 그 승낙이 우리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한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지’라며 상대방이 내 자아 안에 한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락하는 순간, 그 뒤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내가 서민 교수의 글을 보며 경악했던 것도 이 대목이다. “문빠가 언론을 탄압한다”는 그의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걸 왜 조선일보에 기고한단 말인가? 내가 우리나라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것이다. 조중동이 기고 요청을 했을 때 덥석 받아들이는 거다. 아무리 문빠가 싫고 문재인 정부가 싫어도, 우리가 진보인 한 우리는 진보의 바다에서 싸워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심지어 나는 조중동의 요청이 합리적이어도(이건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요청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집 문 안쪽에 저쪽의 한발이 넘어온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의 한 발을 걸치게 해 주면 그 다음 더 무리한 요청이 와도 거절이 힘들다. 치알디니 교수의 경고처럼 문전걸치기 전략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리 사소한 요청도 승낙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만 더 덧붙인다. 그렇게 그 신문에 기고하면 그 신문이 서 교수를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할 것 같은가? 웃기는 이야기다.
내가 동아일보에 막 입사했던 1990년대 후반, 유시민 작가가 동아일보에 ‘유시민의 세상 읽기’라는 칼럼을 연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동아일보는 수평적 정권교체의 1등 공신이었고 꽤 괜찮은 신문이었기에 유 작가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것은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동아일보가 꼴통 수구보수가 되면서 동아일보 안에서 “유시민 그 XX는 우리가 다 키워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욕한다. 배은망덕한 XX다”라고 쌍욕을 퍼부었다. 내 귀로 직접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다.
서민 교수는 알아야 한다. 그런 기고를 한다고 조선일보가 서 교수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서 교수가 조선일보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냈을 때, 그들은 “기생충 교수 그 XX, 2020년에 우리가 칼럼 실어주면서까지 키워줬는데 배은망덕이 짝이 없다”고 뒤통수를 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