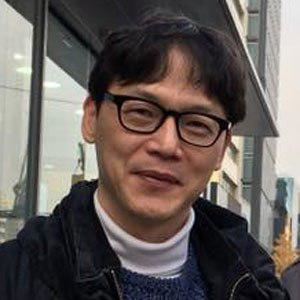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한국 법조기자들은 기자의 사명을 잘 못 이해하고 있다
필자가 종합일간지에서 일하던 시절의 일화. 사회부에서 5년 넘게 경찰 기자를 한 덕에 바로 옆 팀 법조 기자들의 분위기를 볼 기회가 종종 있었다. 필자가 일하던 그 신문에서는 ‘압도적인 에이스’라 불리던 법조의 전설이 있었다. 특종을 밥 먹듯 집어와 그에 대한 회사의 신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술자리에서 그 전설 선배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선배의 단호한 한 마디는 이랬다.
“특종을 어떻게 하냐고? 무조건 검사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해!”
속보 경쟁이 만든 셀러스 마켓
이것이 대한민국 법조 기자들의 일반 정서다. 법조 기자의 특종이란 검찰이 흘리는 수사 내용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보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연 검사와 ‘짜고 치기’를 잘 하는 능력이다.
그 선배는 그 기술을 “검사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결국 그 말은 기자가 검사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극단적 속보 경쟁은 법조 기자들의 생태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남들보다 검사로부터 조금 더 일찍 귀띔을 들었던 자들이 고속 승진을 한다. 그들이 데스크가 되면 후배들에게 똑같은 짓을 강요한다.
특종의 압박을 받은 기자들은 황망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국민일보 소속 한 기자가 북부지청 검사실에서 수사 자료를 훔치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수사 자료를 절도해서라도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기자를 절도범으로 만든 것이다.
경제학에는 셀러스 마켓(seller’s market)이라는 용어가 있다. 공급자(seller)가 압도적인 힘을 갖는 시장을 뜻한다. 시장을 독점한 사업자 있을 때 셀러스 마켓이 형성된다. 물건을 파는 곳이 그곳 하나뿐이니 공급자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제약 회사들이 주도하는 제약 시장이 대표적 셀러스 마켓이다. 미국 제약 회사들은 약을 개발한 뒤 특허를 걸어 그 약을 생산할 권한을 자기들만이 독점한다. 환자 입장에서 목숨이 걸린 일이니 그 약을 안 살 수가 없다. 원가 200원짜리 약 한 알이 수천 만 원에 팔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한국의 법조 기자 생태계가 전형적인 셀러스 마켓의 모습을 보인다.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에 기자들은 검사에게 잘 보여 떡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 혈안이 돼 있다. 검사들은 기자들의 그런 속성을 이용해 마음껏 낚시질을 한다. 필요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를 슬쩍 흘리기만 하면 기자들은 ‘단독’을 붙여 대문짝만하게 보도한다.
한 언론사에만 정보를 줬다고 다른 언론사들이 항의하지도 않는다. 항의는커녕, 단독을 빼앗긴 타사 기자들이 검사에게 달라붙어 “저한테도 하나 주셔야죠. 저 이대로 회사 들어가면 죽어요”라며 우는 소리를 한다. 셀러스 마켓의 주인공인 검사는 마음껏 여론을 주무르며 그것을 즐긴다.
기자의 실력과 진정성이 바이어스 마켓을 만든다
셀러스 마켓에 대비되는 용어가 바이어스 마켓(buyer’s market)이다. 셀러스 마켓과 달리 수요자, 즉 소비자들이 압도적 힘을 갖는 시장을 뜻한다.
기업들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 그렇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되레 공급자가 수요자들에게 잘 보이려 온 힘을 다한다. 말 그대로 ‘고객이 왕’인 시장이다.
물론 검찰과 언론의 관계에서 바이어스 마켓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미국에는 법조 기자의 전설로 불리는 린다 그린하우스(Linda Greenhouse, 1947~)라는 기자가 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연방 대법원을 출입한 기자다.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린하우스 효과(Greenhouse effect)라는 미디어 이론이 탄생했을 정도다.
이 이론의 요지는 이렇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그린하우스 기자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에 그들의 판결을 바꾼다는 것이다.
실로 놀랍지 않은가? 미국 연방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다. 즉 한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대법관으로 지낸다. 대법관들로 하여금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이 때문에 미국 대법관들의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런데 그 대법관들이 그린하우스라는 법조 기자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판결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다. 그린하우스로의 한 마디가 대법관의 판결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바이어스 마켓이다.
그린하우스는 1시간 빠른 특종, 하루 빠른 단독으로 명성을 얻은 기자가 아니다. 1998년 그린하우스의 퓰리처상 수상 사유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었다.
그린하우스는 속보 경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판결문을 그야말로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 논평했다. 기사의 수준이 너무나 높아 대법관들조차 기사 내용에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것이다. 기자는 정보를 쥐고 있는 취재원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 취재원이 권력기관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정보 몇 조각에 굽실대는 순간 한국의 검찰처럼 정보를 쥐고 있는 곳은 피의사실을 적절히 흘리며 기자들을 꼭두각시로 만든다.
반면 그린하우스처럼 취재원이 꼼짝 못할 수준의 취재와 공부로 무장하면 되레 취재원이 기자의 눈치를 본다. 검사들이 너무나 아파할 정곡을 찌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상을 바꾸는 언론의 힘은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온다. 이런 사명감이 기자에게 있어야 한다.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 얻어듣고 ‘단독’ 붙이는 게 무슨 기자의 사명이란 말인가?
요즘 들어 법조 기자의 검찰의 유착이 부각돼서 그렇지, 필자가 알기로 이런 관행은 수십 년 째 이어져온 구태였다. 이제 제발 이 한심한 짓을 멈춰야 한다. 기자가 국민 편에 서서 검찰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지, 기자가 검찰 편에 서서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되겠나?


